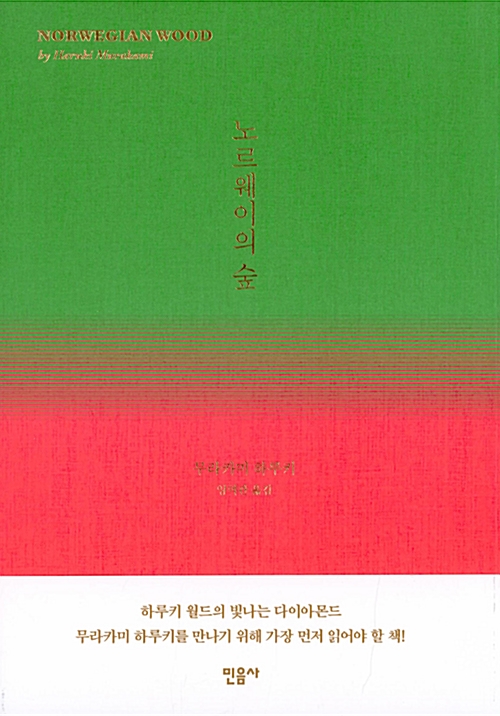
“레이코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있죠, 그 장례식, 너무 쓸쓸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렇게 죽어 가는거야. 나도 자기도.”
사람은 결국 죽는다. 누군가는 세상에 남겨져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격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흔적까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에 뿌리를 내린 채로 타인의 가슴 속에 큰 구멍을 남기고 만다. 상실감. 심중에 공백이 생겨버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은 이런 공허감을 작품 속 개개인의 삶을 통해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언니와 남자친구인 기즈키의 죽음으로 망가진 심리 상태를 가진 나오코, 기즈키의 자살로 죽음이 삶의 대극이 아닌 일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오코의 죽음에 방황하는 와타나베까지.
‘생의 끝’이라는 소재는 작품 전체를 관통해 나타나며, 우리에게 죽음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과 대조적인 ‘관계 맺음’의 반복적 노출은 죽음의 일상성을 더욱 부각함으로써 자연스레 독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혹은 “내 죽음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을까?” 같은 내면 속 질문의 연속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아닌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있는 ‘지금, 이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독자는 자신과 소설 속 인물을 동일시함으로써 상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의 깊은 여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소재는 자칫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될 자신들의 삶에 대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무력감과 연민의 손끝으로 글을 읽어 나간 후에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문장이 하나 있다. 바로, 나가사와 선배의 조언.
“자신을 동정하지 마. 자신을 동정하는 건 저속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에게 느끼던 연민의 알은 그의 조언으로 금이 가고 결국 깨지고 만다. 종착점의 외로움이 아닌, 시발점의 설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점이 나가사와의 조언을 많은 사람이 <노르웨이의 숲> 속 최고의 명대사라고 뽑는 이유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외로움과 상실감에 젖어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 보기를 바란다.
안성재(문과대 국문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