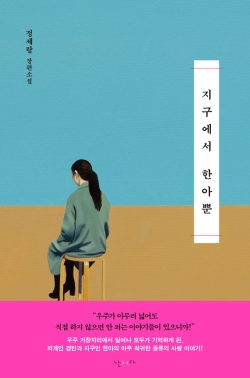
정세랑
여기 지구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외계인이 있다. 만약 그가 이 별에 거주 중인 유일한 외계인이라면 덕지덕지 붙은 앞의 수식어가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동시에 가장 사랑에 미친 사람, 아니 외계인이다. 은하계 가장자리에서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사랑. 모든 것을 버리고 자그마치 2만 광년을 날아온 사랑. 지구 생명체 중 아는 것이라곤 '한아'뿐인 이 외계인은 그 하나를 만나기 위해 지구로 향했다. 한아의 남자친구인 경민의 얼굴과 몸을 빌려 한아에게 접근한 그는 제법 로맨틱하게 말했다.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 반하는 바람에, 우리 별 전체가 네 꿈을 꿨던 거?”
경민이, 그러니까 경민의 형태를 한 외계인이 한아에게 반한 이유는 이러하다. 한아는 지구를 사랑했고, 그래서 지구의 특성을 거스르는 사람이었다. 인간이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 행성에서 한아는 하나로 이어진 모든 생명체의 고리를 선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누구보다 생명을 사랑했다. 그건 우주의 법칙인 동시에 우주를 통과하는 일이었다. 그 시각, 이름 모를 행성의 경민은 망원경으로 이를 전부 지켜보며 생각했다. 너는 우주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넘어서는 걸까.
경민은 사랑을 원료로 우주선을 가득 채우고 2만 광년을 넘어 푸른 별에 도착했다. 차원이 다른 우주의 교통비는 그가 남은 일생을 착실히 갚아나가도 모자랄 규모의 빚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행성에 어떻게 그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착륙할 수 있었을까. 한아와 경민 사이 시간의 공백과 어쩌면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이종(異種)의 간극을 염두에 두고도 어떤 범우주적인 힘은 그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우주를 넘어서는 작은 지구인 하나에게 우주를 넘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힘 덕분이다.
정세랑이 제시하는 세계는 비현실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다. 마치 지구 어딘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환상적인 그의 세계는 독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다.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다 정신을 차려보면 한아의 손을 붙잡고 경민의 망원경으로 은하계 너머를 관찰 중인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매력적으로 모난 캐릭터들이 내비치는 순간순간의 다정함 역시 그 세계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이다. 어떤 문단에선 위로를, 어떤 문단에선 희망을 전하며 각기 다른 질감의 사랑 조각을 모두 모아 한 편의 이야기로 기워낸다. <지구에서 한아뿐>은 그가 가진 모든 사랑의 응집체이자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구의 산물이다. 문장과 문장의 사이마다 오래 끓여 잼같이 눅진해진 사랑이 흘러내린다. 인류애가 건조하게 갈라지는 메마른 하루 틈, 방울방울 떨어지는 사랑 묻은 활자들에 기꺼이 몸을 내맡겨본다.
김나경(미디어20)
